정신질환은 복잡한 원인과 많은 변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여러 연구들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정신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전자 변이는 우울증,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과 같은 신경정신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이는 뇌의 화학 또는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나 뇌 회로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자폐증과 유전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고, 자폐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은 단일 종류의 유전적 결실에 의해 생기는 한 종류의 질환이 아닌
다양한 유전적 변이에 의해 초래된 질환 클러스터이다.
1.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무엇인가?
자폐는 인간만이 하는 언어, 복잡 지능, 개인 간 교류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자폐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폐증과 유전자에 대해 알아가기에 앞서 이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대인 관계, 언어 소통, 특정 관심사와 행동의 제한된 범위를 포함하는 스펙트럼으로 분류된다.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의 주요 증상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 패턴, 관심사의 협소화 등이 있다. 약 200명 중 1명의 아이가 자폐증 진단을 받으며, 남아가 여아의 3배 정도로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증의 임상적 증상은 3세 이전에 나타나며, 종종 그전에 습득한 언어도 잊어버리는 퇴화기도 거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러 가지 증상과 심각도로 나타난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상을 보인다. 자폐아는 정상아에 비해 발작 빈도가 높고, 인식능력에도 문제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신체불구도 나타나지만, 또 다른 자폐의 경우 정상 혹은 정상 이상의 지능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보살핌 속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2.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전적 관계
자폐증은 매우 큰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McGue와 Buchard의 연구에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일란성쌍둥이가 50%만 유전자 공유를 하는 이란성쌍둥이에 비해 자폐증이나 자폐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정신불열, 정서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자폐는 인간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질환이다.
이는 다른 영역은 정상이지만 사회적인 의사소통에서만 자폐가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인식 기능이 모듈식(modular)으로 조합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스코어 0은 두 사람 간에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내며, 스코어 1은 동시 발생을 의미한다.
일란성쌍둥이의 자폐증(Autism) 상관성 0.6 정도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상관성은 거의 1이다.
일란성쌍둥이는 거의 모든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50% 유전자만 공유하는 이란성쌍둥이에 비해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결과는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은 유전자의 영향이 큰 질환임을 시사하며,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을 확률이 높다.
3.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유발하는 유전자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자폐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된 질환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유전적 복합성을 인식하는 것이 자폐증이나 자폐 연관 증후군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고전적 자폐증 증상은 유전적 원인이 밝혀진 다른 여러 유전병의 증상과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는데, 실제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1) 취약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
X염색체 상의 특정한 단일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 돌연변이와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 주로 남자아이, 낮은 사회적 인지, 높은 사회적 불안, 반복행동의 증상을 보이며, 긴 얼굴과 돌출된 귀의 신체적 특성을 보인다. 이 증후군이 남성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1개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의 X 염색체 상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그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임(여자는 X 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임상적 증상이 없는 보인자가 된다.)
2) 레트증후군(Rett syndrome)
여성 정신지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레트증후군은 메틸 CpG 결합단백질 2(MeCP2)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레트증후군은 X염색체와 연관된 점진적 신경발생질환으로, 레트증후군을 가진 남성 배아는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만 나타난다. 레트증후군의 여아는 생후 6~18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이후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할 때 조절이 어려운 손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4. 정신질환과 다유전 특질 연구의 한계
자폐증은 매우 일반적인 질환인데 비해 오히려 레트증후군과 같은 희귀 질환에 비해 이해도가 낮다.
그 이유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병(psychiatric disorder)에도 적용된다. 정신분열증, 만성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이 일반적인 인간 정신질환들도 유전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폐와 같이 유전적 기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이 방법을 통해 확인된 유전병을 소개한다.
- 부모유전 각인 (parental imprinting)
멘델유전은 인간의 유전질환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부모유전 각인(parental imprinting)이라는 유전자 조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인간은 모든 상염색체를 두 개씩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어떤 유전자들은 두 개중 오직 한 개에서만 mRNA를 발현한다. 에인절만 증후군(Angelman syndrome)과 프래터 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은 부모유전각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다.

위 그림은 각인된 유전자가 두 염색체 중 오직 하나의 염색체(부계 혹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서만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인절만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모계로부터 온 염색체에서만 발현하다. 만일 이 염색체에 결실이 있으면(점선표시 부분), 그 아이는 질병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환과 관련된 DNA 병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DNA 병변이 부계 유전인지, 모계 유전인지 알아야 한다.
1) 에인절만 증후군 (Angelman syndrome)
정신지체, 간질, 실어증, 과잉활동, 부적절한 웃음 등을 동반하는 유전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염색체 15q11-q13 부위 한 카피에 있는 일군의 유전자들의 결실에 의해 생긴다. 에인절만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모두 모계 염색체에서만 발현된다. 그러므로 만일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정상 염색체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부분결실이 있는 비정상의 염색체를 물려받을 경우 그 아이는 에인절만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아버지정상, 어머니 부분결실의 경우)는 에인절만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에인절만 증후군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유비퀴틴 단백질 결합요소(ubiquitin protein ligase)인 UBE3A이다. 유비퀴틴 결합요소는 단백질의 분해와 제거(turnover)를 유도하는 효소로, UBE3A의 중요한 표적 단백질이 아마도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활성조절을 통해서 일반적인 뇌가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 프래터 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
비만, 강박행동, 조울증, 그 외 전반적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는 유전질환이다. 에인절만 증후군처럼 15q11-q13 염색체 부분결실에 의해 생긴다. 하지만, 프래터 윌리 증후군은 부계유전이다.
최근 Catherine Dulac이 쥐를 이용한 연구에서 부모유전각인이 다른 조직보다 뇌조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면, 왜 인간 행동특질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된다.
지금까지 유전자와 자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특질은 다유전성이고, 인간의 정신병이나 행동이 단일유전자의 변이만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서 무한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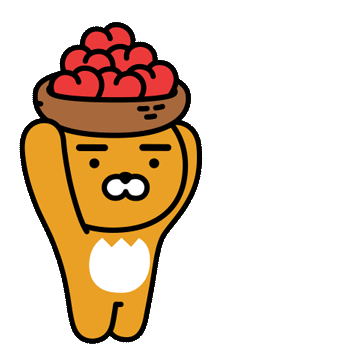
'신경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악] 알코올 의존증 (1) | 2024.05.01 |
|---|---|
| 2024년 세계뇌주간(Brain Awareness Week, BAW) (0) | 2024.03.11 |
| 유전자와 행동(Gene and Behavior) (3) | 2024.03.06 |
| 교세포(gila) (4) | 2024.02.16 |
| 뉴런(Neuron) (2) | 2024.02.15 |


